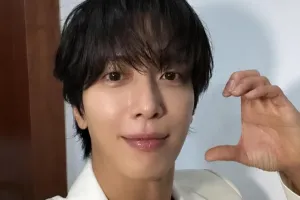“목청은 커지고 몸매는 넉넉해진….” 한때 ‘아줌마’는 이런 식으로 치부되곤 했다. ‘아줌마’가 주는 이미지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시끄럽고 염치없고 교양 없음’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다. 반대편에 있는 ‘아저씨’는 그렇지 않았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따라 붙었다. 그들은 염치도 있었고 따듯하게 그려졌다. 언제나 다정한 이웃이었다. ‘이웃’에는 ‘아줌마’ 대신 거의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는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표현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아저씨’는 구수하고 따스한 이웃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최근 이런 ‘아저씨’와 다른 ‘아저씨’가 등장했다. 이른바 ‘개저씨’다. ‘개 같은 아저씨’ 혹은 ‘개념 없는 아저씨’라는 의미로 쓰인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개저씨’ 체크 목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요약된다. ‘식당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한다. 분위기를 띄운다고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적 농담을 한다. 아랫사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강요한다.’
어찌 보면 이전의 ‘꼰대’ 같기도 하다. 하지만 꼰대와 좀 다르다. 한발 더 나갔다. 남성 우월주의적 행동에 따른 ‘추태’가 곁들여진다.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도 등장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에서 ‘개저씨’는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았다. “술은 아가씨가 따라야 한다”고 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냐”고 호통도 친다. 주변의 타박에도 당당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고 ‘아랫사람’이었다. ‘아랫사람’들이 ‘개저씨’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우리 때에 비하면~”이라고 하는 아저씨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본래 친족어였다. ‘아저씨’는 친족어 가운데서도 의미를 가장 넓게 확대해 나간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②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③남남끼리에서 성인 남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④고모부나 이모부를 이르는 말. ⑤『북한어』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아저씨’는 아버지의 사촌, 육촌 형제들에 대한 호칭이었다. ‘나’에게는 오촌이나 칠촌이 ‘아저씨’다. 홍명희의 ‘임꺽정’에 보이는 ‘아저씨’가 처음의 의미였을 것이다. “저분은 우리 집 오촌 당숙이시니 네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한다.”(홍명희, ‘임꺽정’) 오촌, 칠촌을 넘어서면 친척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그래도 아저씨고 아저씨뻘이 된다. 이웃에 사는 아버지뻘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아저씨’가 됐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섯 번째 풀이는 일반적인 ‘아저씨’와 많이 다르다. ‘언니의 남편’이라고 돼 있다. 곧 ‘형부’에 대한 뜻풀이다.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도 분명히 보인다.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아저씨’의 두 번째 뜻풀이에 이렇게 돼 있다. ‘형부’라고도 하지만 주로 ‘아저씨’라고 하는 모양이다. 물론 ‘형부’ 외에 남녘에서 쓰는 ‘아저씨’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제부’는 남북이 같다.
이경우 기자 wlee@seoul.co.kr
최근 이런 ‘아저씨’와 다른 ‘아저씨’가 등장했다. 이른바 ‘개저씨’다. ‘개 같은 아저씨’ 혹은 ‘개념 없는 아저씨’라는 의미로 쓰인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개저씨’ 체크 목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요약된다. ‘식당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한다. 분위기를 띄운다고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적 농담을 한다. 아랫사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강요한다.’
어찌 보면 이전의 ‘꼰대’ 같기도 하다. 하지만 꼰대와 좀 다르다. 한발 더 나갔다. 남성 우월주의적 행동에 따른 ‘추태’가 곁들여진다.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도 등장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에서 ‘개저씨’는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았다. “술은 아가씨가 따라야 한다”고 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냐”고 호통도 친다. 주변의 타박에도 당당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고 ‘아랫사람’이었다. ‘아랫사람’들이 ‘개저씨’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우리 때에 비하면~”이라고 하는 아저씨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본래 친족어였다. ‘아저씨’는 친족어 가운데서도 의미를 가장 넓게 확대해 나간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②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③남남끼리에서 성인 남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④고모부나 이모부를 이르는 말. ⑤『북한어』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아저씨’는 아버지의 사촌, 육촌 형제들에 대한 호칭이었다. ‘나’에게는 오촌이나 칠촌이 ‘아저씨’다. 홍명희의 ‘임꺽정’에 보이는 ‘아저씨’가 처음의 의미였을 것이다. “저분은 우리 집 오촌 당숙이시니 네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한다.”(홍명희, ‘임꺽정’) 오촌, 칠촌을 넘어서면 친척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그래도 아저씨고 아저씨뻘이 된다. 이웃에 사는 아버지뻘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아저씨’가 됐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섯 번째 풀이는 일반적인 ‘아저씨’와 많이 다르다. ‘언니의 남편’이라고 돼 있다. 곧 ‘형부’에 대한 뜻풀이다.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도 분명히 보인다.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아저씨’의 두 번째 뜻풀이에 이렇게 돼 있다. ‘형부’라고도 하지만 주로 ‘아저씨’라고 하는 모양이다. 물론 ‘형부’ 외에 남녘에서 쓰는 ‘아저씨’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제부’는 남북이 같다.
이경우 기자 w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