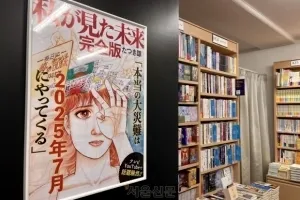нҚјм»Өм…ҳ м—°мЈјмһҗ м •кұҙмҳҒВ·мІјлҰ¬мҠӨнҠё кі лҙүмқё вҖҳмқҢм•…кіј мқёмғқвҖҷмқ„ л§җн•ҳлӢӨ
м—ҙмӮҙ н„°мҡёмқҳ л‘җ лӮЁмһҗлҠ” м—¬лҠҗ нҒҙлһҳмӢқ м—°мЈјмһҗл“ӨкіјлҠ” лӢӨлҘё кёёмқ„ кұём–ҙмҷ”лӢӨ. н•ң лӘ…мқҖ мҠӨл¬јлӢӨм„Ҝм—җ л’ӨлҠҰкІҢ мң н•ҷкёём—җ мҳ¬лқј 8л…„ л§Ңм—җ мҳӨмҠӨнҠёлҰ¬м•„ мң лӘ… мқҢм•…мӣҗмқҳ көҗмҲҳк°Җ лҗҗлӢӨ. нҚјм»Өм…ҳ м—°мЈјмһҗ м •кұҙмҳҒ(36)м”ЁлӢӨ. лӢӨлҘё н•ң лӘ…мқҖ мӨ‘ 3л•Ң лҸ…мқјлЎң мң н•ҷмқ„ л– лӮҳ м—°мЈјмһҗмҷҖ кіјн•ҷмһҗмқҳ кёёмқ„ лҸҷмӢңм—җ кұ·кі мһҲлӢӨ. мІјлҰ¬мҠӨнҠё кі лҙүмқё(26)м”ЁлӢӨ. л‘җ мӮ¬лһҢмқҖ м§ҖлӮң 13мқј лҒқлӮң м„ңмҡёмӢңмң мҠӨмҳӨмјҖмҠӨнҠёлқјмҷҖмқҳ нҳ‘м—°кіј лҢҖкҙҖл №көӯм ңмқҢм•…м ң м°ёк°ҖлҘј мң„н•ҙ к°Ғк°Ғ лӘЁкөӯмқ„ м°ҫм•ҳлӢӨ. вҖҳлҠҰк№ҺмқҙвҖҷмҷҖ вҖҳмІңмһ¬вҖҷм—җкІҢ мқҢм•…кіј мқёмғқмқ„ л¬јм–ҙліҙм•ҳлӢӨ.<м •кұҙмҳҒ>
충лӮЁ мҳҲмӮ°м—җм„ң лҶҚл¶Җмқҳ м•„л“ӨлЎң нғңм–ҙлӮң мҶҢл…„мқҖ мӨ‘н•ҷкөҗ л•Ңк№Ңм§ҖлҠ” мқҢм•…кіј лӢҙмқ„ мҢ“кі мӮҙм•ҳлӢӨ. кі көҗ мһ…н•ҷмӢқлӮ , л°ҙл“ңл¶Җ м„ л°°к°Җ л¶ҲлҚҳ вҖҳмқҖмғү м•…кё°вҖҷм—җ л°ҳн–ҲлӢӨ. лӮҳмӨ‘м—җ нҠёлЎ¬ліёмқҙлһҖ кұё м•Ңм•ҳлӢӨ. лӢӨмқҢ лӮ мқҢм•…мӢӨмқ„ кё°мӣғлҢҖлҚҳ мҶҢл…„м—җкІҢ м„ л°°лҠ” нҠёлЎ¬ліёмқ„ л¶Ҳм–ҙліҙлқјкі н–ҲлӢӨ. мӣ¬кұё, нҢ”мқҙ 짧아м„ң нҠёлЎ¬ліё мҠ¬лқјмқҙл“ңлҘј лҒқк№Ңм§Җ л»—м§Җ лӘ»н–ҲлӢӨ. м„ л°°лҠ” нҠёлҹјнҺ«мқ„ л¶Ҳм–ҙліҙлқјлҚ”лӢҲ мһ…мҲ мқҙ л„Ҳл¬ҙ л‘җкәјмӣҢ м•Ҳ лҗңлӢӨкі н–ҲлӢӨ. н’Җмқҙ мЈҪм–ҙ мқҢм•…мӢӨмқ„ лӮҳк°Җл ӨлҚҳ м°°лӮҳ, л§ҲлҰјл°”лҘј нҲӯнғҒкұ°лҰ¬лҚҳ м„ л°°к°Җ л‘җл“ңл Ө ліҙлқјкі н–ҲлӢӨ. м • көҗмҲҳлҠ” вҖңнҷ”лҸ„ лӮ¬лҚҳ н„°лқј лҜём№ң л“Ҝмқҙ л‘җл“ӨкІјлҠ”лҚ° м„ л°°к°Җ мһ¬лҠҘ мһҲлӢӨкі н•ҳлҚ”лқј. к·ёлҹ°лҚ° лӮҳмӨ‘м—җ м•Ңкі ліҙлӢҲ лӢӨлҘё лҸҷкё°л“ӨлҸ„ вҖҳмІңмһ¬вҖҷлқјкі н•ҳл©° лӘЁл‘җ кҫҖм—ҲлҚ”лқј.вҖқкі нҡҢмғҒн•ҳл©° мӣғм—ҲлӢӨ.

лҸ„мӨҖм„қкё°мһҗ pado@seoul.co.kr
вҖңмқҢлҢҖ 진н•ҷмқҖ кҝҲлҸ„ лӘ» кҫёкі нҳјмһҗ лҜём№ң л“Ҝмқҙ м—°мҠөн–ҲлӢӨ.вҖқлҠ” м •кұҙмҳҒ көҗмҲҳ.
лҸ„мӨҖм„қкё°мһҗ pado@seoul.co.kr
лҸ„мӨҖм„қкё°мһҗ pado@seoul.co.kr
2000л…„ мҳӨмҠӨнҠёлҰ¬м•„ лҰ°мё лЎң л– лӮ¬лӢӨ. лҸ…мқјм–ҙлҠ” мһ…лҸ„ л»ҘкёӢ лӘ» н–Ҳкі лӮҳмқҙк№Ңм§Җ л§ҺмқҖ к·ёлҠ” нҷҳмҳҒл°ӣм§Җ лӘ»н–ҲлӢӨ. л‘җ лІҲмқҙлӮҳ мӢңн—ҳм—җ л–Ём–ҙмЎҢкі лҸҲлҸ„ л–Ём–ҙмЎҢлӢӨ. нҳ№мӢңлӮҳ н•ҳлҠ” кё°лҢҖлЎң л№Ҳ көӯлҰҪмқҢлҢҖм—җ мқ‘мӢңн–ҲлӢӨ. 18лӘ…мқҳ м§Җмӣҗмһҗ мӨ‘ мң мқјн•ҳкІҢ н•©кІ©н–ҲлӢӨ.
вҖңвҖҳл“ңлҹјлқјмқёвҖҷ(лҜёкөӯ лҢҖн•ҷ л°ҙл“ңл¶Җмқҳ л“ңлҹј л°°нӢҖмқ„ лӢӨлЈ¬ мҳҒнҷ”)м—җ лӮҳмҳӨлҠ” вҖҳлЈЁл””л©ҳн„ёвҖҷ мһҘлҘҙлҘј мӢӨкё°мӢңн—ҳ мһҗмң кіЎмңјлЎң м—°мЈјн–ҲлӢӨ. нҒҙлһҳмӢқ нғҖм•…кё° н…ҢнҒ¬лӢүл§Ң кө¬мӮ¬н•ҳлҠ” лӢӨлҘё н•ҷмғқл“Өкіј лӢ¬лҰ¬ ліҙмҳҖлҚҳ лӘЁм–‘мқҙлӢӨ.вҖқ
м ‘мӢңлӢҰмқҙ, кҙҖкҙ‘к°Җмқҙл“ң л“ұ м•„лҘҙл°”мқҙнҠёлЎң мғқкі„лҘј мң м§Җн•ҳл©ҙм„ң л№Ҳ мқҢлҢҖм—җм„ң 8л…„мқ„ к°Ҳкі лӢҰм•ҳлӢӨ. вҖңн‘ңнҳ„н• мҲҳ мһҲм–ҙм•ј мҳҲмҲ вҖқмқҙлқјлҠ” м§ҖлҸ„көҗмҲҳ л°ңн„° нҢҢмқҙкёҖмқҳ к¶Ңмң лЎң м§Җнңҳкіјм •лҸ„ мқҙмҲҳн–ҲлӢӨ. 2008л…„ мөңмҡ°мҲҳ м„ұм ҒмңјлЎң мЎём—…н•ң к·ёлҠ” л№Ҳмқҳ н”„лқјмқҙл„Ҳ мҪҳм„ңл°”нҶ лҰ¬мӣҖ көҗмҲҳк°Җ лҗҗлӢӨ. мҳ¬ мҙҲк№Ңм§Җ л№Ҳ көӯлҰҪмқҢлҢҖ мҙҲмІӯкөҗмҲҳлЎңлҸ„ мқјн–ҲлӢӨ. л‘ҳ лӘЁл‘җ лҸҷм–‘мқё мөңмҙҲлӢӨ.
к·ёк°Җ мҶҢмӨ‘н•ҳкІҢ м—¬кё°лҠ” к°Җм№ҳлҠ” мқҢм•…мқ„ нҶөн•ң мҶҢнҶө. мң нҠңлёҢм—җ л ҲмҠЁ лҸҷмҳҒмғҒмқ„ мҳ¬лҰ¬кі көӯлӮҙ кіөм—°м—җм„ң м• н”„н„°мҠӨмҝЁмқҳ кіЎкіј м•Ҳл¬ҙк№Ңм§Җ мҶҢнҷ”н•ҳлҠ” кІғлҸ„ к°ҷмқҖ л§ҘлқҪмқҙлӢӨ.
вҖңкҙҖк°қл“Өмқҙ 1мӢңк°„мқ„ 1분мІҳлҹј лҠҗлӮ„ мҲҳ мһҲм–ҙм•ј н•ңлӢӨ. к·ёлҹ° мҰҗкұ°мӣҖм—җ к°җлҸҷкіј мқҳлҜёлҘј лҚ”н•ҙм•ј н•ңлӢӨ.вҖқ
мһ¬лҠҘмқҙ л…ёл ҘліҙлӢӨ мӨ‘мҡ”н•ҳлӢӨлҠ” кІҢ нҒҙлһҳмӢқкі„мқҳ мЈјлҗң мқҳкІ¬мқҙлӢӨ. м • көҗмҲҳлҠ” вҖңнғҖкі лӮҳм•ј н•ҳм§Җл§Ң лҡңл ·н•ң лӘ©н‘ңмқҳмӢқмқҙ мһҲлӢӨл©ҙ к·№ліөн• мҲҳ мһҲлӢӨ.вҖқл©ҙм„ң вҖңм–ҙлҰҙ л•Ңл¶Җн„° мқҢм•…мқ„ л°°мҡҙ кІғлҸ„, н•ңкөӯм—җм„ң мң лӘ…н•ң лҢҖн•ҷмқ„ лӮҳмҳЁ кІғлҸ„ м•„лӢҲм§Җл§Ң, мөңкі мқҳ нғҖм•…кё° м—°мЈјмһҗк°Җ лҗҳкІ лӢӨлҠ” лӘ©н‘ңк°Җ мһҲм–ҙ м—¬кё°к№Ңм§Җ мҷ”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кі лҙүмқё>
лҲ„мқҙк°Җ л°”мқҙмҳ¬лҰ°мқ„ лЁјм Җ л°°мӣ лӢӨ. м—„л§Ҳк°Җ лҲ„мқҙл§Ң мұҷкё°лҠ” кұё ліҙкі м§ҲнҲ¬мӢ¬мқҙ лӮ¬лӢӨ. мҶҢл…„лҸ„ м—¬лҚҹ мӮҙ л•Ңл¶Җн„° мІјлЎңлҘј мӢңмһ‘н–ҲлӢӨ. мҡ”мҰҳ мқҢм•…мҳҒмһ¬л“Өм—җ 비н•ҳл©ҙ лҠҰмқҖ м¶ңл°ң. л¶Ҳкіј 1л…„ л’Ө н•ңкөӯмҳҲмҲ мў…н•©н•ҷкөҗ мҳҲ비н•ҷкөҗ мҳӨл””м…ҳмқ„ ліј л§ҢнҒј л№ЁлҰ¬ лҠҳм—ҲлӢӨ. к·ёкіім—җм„ң мқҖмӮ¬мқё м •лӘ…нҷ” көҗмҲҳлҘј мІҳмқҢ л§ҢлӮ¬лӢӨ.

лҢҖкҙҖл №көӯм ңмқҢм•…м ң м ңкіө
вҖңмңЎмІҙмҷҖ мҳҒнҳјмқ„ лӘЁл‘җ м№ҳмң н•ҳкі мӢ¶лӢӨ.вҖқлҠ” 분мһҗмғқл¬јн•ҷмһҗмқҙмһҗ мІјлҰ¬мҠӨнҠёмқё кі лҙүмқём”Ё.
лҢҖкҙҖл №көӯм ңмқҢм•…м ң м ңкіө
лҢҖкҙҖл №көӯм ңмқҢм•…м ң м ңкіө
мӣҗлһҳлҠ” м•„лІ„м§Җ(кі к·ңмҳҒ м№ҙмқҙмҠӨнҠё мқҳкіјн•ҷлҢҖн•ҷмӣҗ көҗмҲҳ)мІҳлҹј кіјн•ҷмһҗк°Җ лҗҳкі мӢ¶м—ҲлӢӨ. лҜёкөӯ н•ҳлІ„л“ңлҢҖмҷҖ лүҙмһүкёҖлһңл“ң мқҢм•…мӣҗм—җм„ң ліөмҲҳн•ҷмң„ н”„лЎңк·ёлһЁмңјлЎң мғқл¬јн•ҷкіј мІјлЎңлқјлҠ” л‘җ л§ҲлҰ¬ нҶ лҒјлҘј мһЎм•ҳлӢӨ. н”„лҰ°мҠӨн„ҙлҢҖ 분мһҗмғқл¬јн•ҷ л°•мӮ¬кіјм •(2л…„ м°Ё)м—җ м Ғмқ„ л‘” кі лҙүмқём”ЁлҠ” м„ёнҸ¬мҷҖ лӢЁл°ұм§Ҳмқҳ мғҒнҳё мҳҒн–Ҙ л©”м»ӨлӢҲмҰҳмқ„ л°қнҳҖ мң л°©м•” м№ҳлЈҢ м—ҙмҮ лҘј м°ҫлҠ” мқјм—җ лӘ°л‘җн•ҳкі мһҲлӢӨ.
вҖңмӢӨн—ҳмқҙ мӣҢлӮҷ л§Һм•„ м—°мЈјнҷңлҸҷмқ„ лі‘н–үн•ҳлҠ” кІҢ мүҪ진 м•ҠлӢӨ. н•ҳм§Җл§Ң м–ҙлҰҙ л•Ңл¶Җн„° кіјн•ҷмһҗлҘј кҝҲкҝЁкі мқҢм•…к°Җмқҳ кёёмқ„ мӨ„кі§ кұём–ҙмҷ”кё° л•Ңл¬ём—җ н•ҳлӮҳк°Җ м—Ҷмңјл©ҙ мӮ¶мқҳ к· нҳ•мқҙ к№Ём ё л¶Ҳн–үн•ҙм§Ҳ кІғ к°ҷлӢӨ.вҖқлҠ” кі лҙүмқём”ЁлҠ” вҖңнҠ№лі„н•ң м—°мЈјлҘј нҶөн•ҙ мҲҳл°ұ мҲҳмІң мІӯмӨ‘мқҳ мҳҒнҳјмқ„ м№ҳмң н• мҲҳ мһҲлҠ” кІғмІҳлҹј, мң л°©м•” м№ҳлЈҢ л°©лІ•мқ„ м°ҫлҠ”лӢӨл©ҙ мҲҳмІң мҲҳл§ҢлӘ…мқҳ мғқлӘ…мқ„ мӮҙлҰҙ мҲҳ мһҲлӢӨлҠ” м җм—җм„ң л‘ҳ лӢӨ л§Өл Ҙм ҒвҖқмқҙлқјкі к°•мЎ°н–ҲлӢӨ.
к°ҷмқҖ м§Ҳл¬ёмқ„ лҚҳмЎҢлӢӨ. м„ мІңм Ғ мһ¬лҠҘкіј нӣ„мІңм Ғ л…ёл Ҙ мӨ‘ м–ҙл–Ө кІҢ мӨ‘мҡ”н•ңм§Җ. вҖңмӢӨлӮҙм•… м•ҷмғҒлё”мІҳлҹј лӢӨлҘё мқҙмқҳ м—°мЈјм—җ л°ҳмқ‘н•ҳл©ҙм„ң к°ҷмқҙ нҳ‘м—°н•ҳлҠ” кІғмқҖ лҲ„к°Җ к°ҖлҘҙм№ҳкұ°лӮҳ л…ёл Ҙн•ңлӢӨкі лҗ мқјмқҖ м•„лӢҲлӢӨ. м„ мІңм Ғмқё мһ¬лҠҘ, ліёлҠҘм Ғмқё к°җк°Ғмқҙ н•„мҡ”н•ҳлӢӨ. л¬јлЎ л…ёл ҘмқҖ лӢ№м—°н•ң м–ҳкё°лӢӨ.вҖқ мҡ°л¬ёмқҙм—ҲлӮҳ ліҙлӢӨ.
лӘЁл‘җ к·ёлҘј мІңмһ¬лқјкі л§җн•ҳлҠ”лҚ° мһҗмӢ мқҖ м–ҙл–»кІҢ мғқк°Ғн• к№Ң. вҖңлӮң л…ёл ҘнҢҢлӢӨ. (мІјлЎң) мӢңмһ‘лҸ„ лҠҰм—Ҳкі , н•ӯмғҒ л¶ҖмЎұн•ҳлӢӨлҠ” мғқк°ҒмңјлЎң л…ёл Ҙн–ҲлӢӨ. кіөл¶ҖлҸ„ л§Ҳм°¬к°Җм§ҖлӢӨ. мғқл¬јн•ҷмқҖ мҲұн•ң мӢӨн—ҳмқ„ н•ҙм•ј н•ңлӢӨ. 80~90%лҠ” мӢӨнҢЁн•ҳлӢӨ ліҙлӢҲ мІңмһ¬м„ұліҙлӢӨлҠ” л…ёл Ҙкіј мқёлӮҙмӢ¬, м„ұмӢӨн•Ёмқҙ мӨ‘мҡ”н•ҳлӢӨлҠ” м җм—җм„ң лӮҳмҷҖ л§һлҠ”лӢӨ.вҖқ
мһ„мқјмҳҒкё°мһҗ argus@seoul.co.kr
2011-08-15 20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