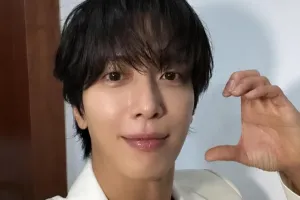이옥순 인도문화연구원장
‘코리아 카라반’은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인도와 인연을 맺으려는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이동식마차를 타고 대상(隊商)처럼’ 집합적 인도가 아닌 개별적 인도, 즉 여러 주 지방을 찾아 이동하는 일련의 행사이다. 수도 델리가 중심인 ‘큰 인도’가 아닌 지방의 ‘작은 인도’를 찾아가서 양국 간의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대사가 모두발언에서 ‘비즈니스보다 친선’을 강조하여 박수를 받은 건 그래서였다. 이번에 행사가 열린 비샤카파트남은 동부에 긴 해안선을 가진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속한다. 우리 독자들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고대에 불교가 아주 성했던 곳으로 역사교과서에도 등장한다. 남아 있는 몇 줄의 기록에 따르면, 8세기에 인도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한 승려는 안드라 주의 차기 주도로 내정된 아마라바티의 한 수도원에서 10년간 머물며 산스크리트어와 불법을 배웠다. 양측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된 셈이다.
현재의 경제적 이득이 없을지라도 인연을 맺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훗날을 기약하는 이러한 행사는 인도라서 유의미하다. 모든 것이 동질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남북한 영토의 17배인 인도는 안드라처럼 인구 5000만이 넘는 주가 10개나 되기 때문이다. 세계 7위의 영토로 인구 대국 세계 1위를 예약한 인도를 하나의 세계로 상대할 수는 없다. 사실 인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복수였다. 즉 다양성이 인도역사의 상수였다.
그런 인도를 하나의 대상(對象)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엔 아직 많다. 인도는 더는 제3세계의 빈곤국이 아니지만, 인도를 여전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굳이 말한다면 인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인구가 많기에 가난한 사람이 많을 뿐이다. 따라서 부자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인도는 경제적으로도 천차만별의 땅이다. 그들을 한두 마디로 정의하는 건 무지를 넘어 무모한 일이다.
바다로 세계를 향한 항구도시 비샤카파트남에서 느꼈듯이 오늘날의 인도는 이전의 역사에서 종종 그랬듯이 먼지를 만져도 황금이 되는 번영의 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한때 인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무굴제국이 호령하던 1600년대의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70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지배를 받으며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인도가 지난 25년간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 분투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서는 ‘떠오르는 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자신감이 들어간 각종 구호가 춤을 추고 21세기 슈퍼파워가 되려는 열정이 전국 도처에서 묻어난다. 돈과 힘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간형도 등장했다. 글로벌세상에서 활약하는 인도인도 엄청나게 많다. 특히 노쇠해 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 인도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도 늦기 전에 역동적인 여러 지방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리아 카라반’이 그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2015-10-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