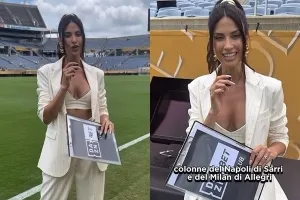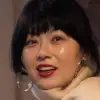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오늘로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한·일 관계는 과연 장년의 연륜에 걸맞은 중후하고 안정적인 풍모를 갖추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너무도 참담한 몰골이다. 수교 50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반목과 갈등이 증폭돼 있다. 반일 감정이 하늘을 찌르고, 혐한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실타래가 얽히고설켜 어찌해 볼 엄두를 못 낼 상황이다. 반세기 전으로 되돌아간 한·일 관계는 회복이 시급하지만 솔직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날아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외교 수장의 일본 방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외교 수장의 첫 방일 자체가 두 나라 관계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그나마 양국 정상이 오늘 각각 상대국 수도에서 열리는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다행이다. 최소한 더이상의 파국은 막아 보자는 공감대가 양국 간에 형성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타래를 풀려면 50년 전 수교 당시로 필름을 되돌려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원천이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인지 살펴봐야만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고쳐 끼우면 그만이다. 큰 수고가 필요하지도 않다.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수교 교섭은 냉전 시기 미국의 입김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장장 13년 넘게 걸렸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상처와 한(恨)이 뿌리 깊었던 것이다.
문제의 원천은 박정희 정권 시기 막후협상을 통해 타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에 그 상처와 한을 치유할 문구가 빠진 데 있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냉전 질서 속에서 어물쩍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 50년 후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냉전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일본은 안전보장, 우리는 경제개발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암은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면 도지게 마련이다.
냉전 붕괴, 민주화, 경제발전으로 우리 국민들은 감춰져 있던 과거사 문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 교과서 왜곡,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 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등 현안들도 주기적으로 대두했다. 특히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더욱더 우경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로 호도하는 아베 총리의 말장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또 한번 피눈물을 흘렸다.
한·일 양국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큰 병에 걸린 양국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수교 반세기를 지나 새로 열리는 반세기, 아니 100년 이후까지 두 나라가 공동 번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되는 아베 담화에 침략과 전쟁,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하고도 절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호소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날아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외교 수장의 일본 방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외교 수장의 첫 방일 자체가 두 나라 관계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그나마 양국 정상이 오늘 각각 상대국 수도에서 열리는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다행이다. 최소한 더이상의 파국은 막아 보자는 공감대가 양국 간에 형성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타래를 풀려면 50년 전 수교 당시로 필름을 되돌려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원천이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인지 살펴봐야만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고쳐 끼우면 그만이다. 큰 수고가 필요하지도 않다.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수교 교섭은 냉전 시기 미국의 입김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장장 13년 넘게 걸렸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상처와 한(恨)이 뿌리 깊었던 것이다.
문제의 원천은 박정희 정권 시기 막후협상을 통해 타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에 그 상처와 한을 치유할 문구가 빠진 데 있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냉전 질서 속에서 어물쩍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 50년 후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냉전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일본은 안전보장, 우리는 경제개발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암은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면 도지게 마련이다.
냉전 붕괴, 민주화, 경제발전으로 우리 국민들은 감춰져 있던 과거사 문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 교과서 왜곡,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 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등 현안들도 주기적으로 대두했다. 특히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더욱더 우경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로 호도하는 아베 총리의 말장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또 한번 피눈물을 흘렸다.
한·일 양국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큰 병에 걸린 양국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수교 반세기를 지나 새로 열리는 반세기, 아니 100년 이후까지 두 나라가 공동 번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되는 아베 담화에 침략과 전쟁,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하고도 절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호소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2015-06-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